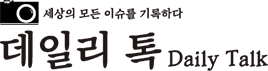독일월드컵에서 벌일 우리의 첫 경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스물세 명의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월드컵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편의점과 백화점 매장에는 월드컵을 대비한 붉은 응원복이 눈에 띄면서, 4년 전 한반도 전체가 함께 누렸던 열정의 축제에 대한 재현의 욕구도 강력히 일고 있다.
2002월드컵 전까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동서로 나뉘고, 여야로 나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노소가 나뉘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척하고 극적인 혐오를 표현하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할 기적이 단계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면으로 볼 때 시청앞 광장에 인파가 하나둘 물들어가듯이 응원팀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하나로 뭉쳐져 갔다.
당시 두 갈래로 나뉘어서 싸우던 토론 프로에서조차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가 되었었다. 참 기이한 현상이었다. 출근하던 회사원들은 운전대를 잡고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오 필승 코리아’를 불렀고, 주부들은 설거지하다가도 ‘필승 코리아’의 흥분으로 콧노래를 불렀다. 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나오는 구호가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조차 호텔 샤워실에서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을 흥얼거렸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강아지들도 애완견용 붉은 티셔츠를 입고 붉은 두건을 두른 채 돌아다녔고, 그 해 6월은 6·10만세가 아니라, 코리아 파이팅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축구 열풍이 ‘축구 여풍’으로 이어지고 도시 농촌 할 것없이 월드컵을 즐겼고, 생방송으로 중계를 보고도 재방송까지 보고 분석 프로까지 보느라고 눈이 빨개진 사람이 많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곤한 줄을 몰랐었다. 출근길에 추돌사고가 나면 웃으면서 그냥 가라고 했고, 해외에 나간 비즈니스맨들은 열정적인 한국인이라는 이미지 덕에 무역에도 ‘플러스 알파’ 효과를 얻었다. 모든 게 신났고 즐거웠다.
축구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었다. 이기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초과하는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순간에 에너지 핵융합과도 같은 커다란 힘을 발휘해서 한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응원할 때 역학으로 말하면 국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라고 하고 그 응원 덕에 대운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것이 곧 음양오행의 균형 조절이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의욕이 다른 개인에게 전파되면서 그 의욕은 한 사회의 지대한 경제 규모를 움직이는 발판이 된다. 밝은 의욕은 곧 그 사회의 크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다지 크지도 않고 둥근 축구공 하나가 연출하는 월드컵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월드컵 축구 시즌이 다가오면 광고회사나 방송사마다 엄청난 마케팅의 호기회로 삼는 것을 보면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 한일월드컵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효과는 5조3000여억원에 이른다. 2002월드컵 때 우리 축구에 300억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300조원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월드컵이다. 이번에도 우리, 이순신장군 동상이 들썩이도록 응원해 보자. 이 ‘신명’이야말로 우리 한국을 살리는 특허요, 한국경제를 살리는 키워드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