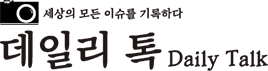석가와 제자 가섭 사이에 연꽃 한 송이를 두고 오간 염화미소(拈華微笑)는 고수의 경지다. 말과 글에 얽매인 세인들에게는 머리 위로 오가는 가르침과 깨달음이 짐작조차 어렵다. 역대 고승들의 알듯 모를 듯한 선문답 또한 같은 맥락이다. 단 몇 마디 외침을 세속의 논리로 접근하려다 보면 함정에 빠진다. 뜻은 문자 너머에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내밀한 관계가 축적한 배타적 의사소통 구조다.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얼마전 법정진술에서 국정원에도 ‘이심전심’이 통용된다고 했다. 국정원장은 수시로 직원들에게 “도청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다음날에도 예외없이 도청 내용을 담은 통신첩보 보고서가 원장실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속내를 읽고 업무를 진행시키는 정보기관의 특성일게다. “도청 지시는 없었다”는 전직 원장들의 주장과 1800명 이상을 상시 도청한 현실 사이의 모순을 해소할 키워드가 바로 이심전심이다.
그러나 독심(讀心)회로의 이상은 비극을 부르기도 한다. 서울의 한 폭력조직 보스가 조직원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돈 가져와”“내용을 들어봐”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은 돈 대신 흉기를 가져왔고, 내용을 듣는 대신 상대 조직을 습격해 1명을 살해했다. 부하는 조직 은어를 통해 보스의 뜻을 읽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스는 부인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심전심이 권력과 만나면 ‘코드’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와 “답안지를 똑같이 쓰는 사이”임을 ‘커밍아웃’했을 때 ‘천생연분’보다는 이심전심이란 표현이 적실했다. 같은 스타일이 꼭 연분인 것은 아니다. 조기숙 홍보수석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노 대통령과 주고받은 곡진한 대화들은 노심(盧心)-조심(趙心) 코드라 할만 하다. 조 수석의 블로그 명칭부터가 ‘이심전심’이다.
코드 공유는 그 자체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탓할 건 아니다. 걱정스럽기로는 코드의 외연화다. 배기원 전 대법관은 엊그제 퇴임사에서 편가르기식 대법관 인사를 비판했다. 일련의 헌재 ‘코드 판결’ 사례도 예사롭지 않다. 거듭되는 ‘PK 봐주기’ 인사에 꼭 무슨 지시가 오갔겠는가. 마음을 통할 필요가, 아니 통해서는 안되는 사이의 이심전심은 서로를 불행으로 내모는 불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