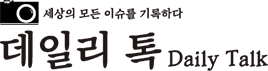탁구는 구기종목 중 가장 작은 공을 사용한다. 공 무게도 가루약 한 봉지 무게와 엇비슷한 2.5g정도다. 그러나 공의 크기와 무게와는 달리 탁구는 70∼80년대 한국스포츠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바로 남과 북의 대치상황 때문이었다. 양측이 모두 세계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어 국제대회 중요한 길목에서 남북대결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탁구는 탁구협회나 대한체육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정책종목이었다.
1973년 ‘사라예보 신화’을 일군 주역들은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전 성적이 좋지 못해 시무룩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개인전과 단체전의 금메달 가치는 다르다. 자신들이 딴 금메달이 앞으로 운명을 바꿀 정도로 대단하게 바뀐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은 “카페레이드 등 국민적인 환영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정부의 전갈을 비행기 안에서 받고서였다.
건국 이후 단체 스포츠에서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의 영광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1972년 10월 초헌법적 조치인 유신선포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던 정권에게는 단체전 우승을 신화로 포장할 정치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는 이렇게 정치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979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킨 디에고 마라도나도 쿠데타로 집권한 비델라 정권의 대중조작 필요에 의해 영웅으로 떠받들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83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에서 한국의 4강신화 역시 당시 정권에 의해 과대포장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스포츠의 정치 오염은 순수한 이념에서 시작된 근대 올림픽운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나치즘과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냉전시대의 올림픽은 강대국들의 국력 과시 대리전이기도 했다.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은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흐른 것은 아니다. 1971년 나고야(일본)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선수단이 당시 중공을 친선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된 핑퐁외교가 ‘죽(竹)의 장막’을 연 것은 스포츠가 세계평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동서독이 1956년 멜버른, 60년 로마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한 것이나 남북이 탁구와 축구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2000년 시드니를 포함, 최근 두번의 올림픽에서 공동 입장한 것도 그런 예이다.
지난해 2월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키로 합의했다. 북핵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현재는 주춤한 상태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로게 위원장도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은 지난 2월 당선 기자회견에서 단일팀 성사를 위해 특사자격으로 방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출신인 김회장으로서는 남북 단일팀 성사는 재임 중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는 큰 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체육계 입장에서 본다면 단일팀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선 단일팀이 1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받을 경우 올림픽만을 위해 외길 인생을 달려온 많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민족의 대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논리 앞에 소수의 불만은 기를 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체육계의 수장이라면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김정길 회장이 평생을 갈고 닦아온 정치력으로 IOC를 설득, 단일팀 구성에 따른 선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먼저 시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