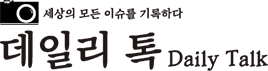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교육정책 수장이 사퇴의 변(辯)으로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를 거론하며 국회 복귀의 필요성을 스스로 내세운 것도 오만으로 비치기 쉽지만, 실정(失政)에 대한 자성은 커녕 그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은 답답하기까지 하다. 재임 1년반의 ‘김진표 교육’은 실험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지난해 1월 김 부총리 취임 당시만 해도 세계의 추세에 발맞춰 한국 교육에도 자율과 경쟁이 확대되리라는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자못 컸다. 앞서 경제부총리 시절에 교육에도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 후 시대착오적 평등주의 교육이념의 전교조에 휘둘리고, 역시 그런 이념의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규제와 평준화 강화로 교육 퇴행을 자초해왔다. 수월성 교육으로 고교평준화의 누적 폐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해온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방침을 공언했다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1·18 신년 연설 직후 바로 백지화로 표변한 김 부총리 아닌가.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지역 제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은 셈인 영어마을 설립에 대한 폄훼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고교내신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전국 대학에 사실상 강요하며 고교간의 엄연한 학력차 인정을 금한 것도 다르지 않다.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의 강화로 결국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심화시켜왔다.
김 부총리는 사의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자립형 사립고 등과 관련해 소신을 바꿨다고 혹평하는데,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해 추진한 것”이라며 “중등교육은 평준화의 틀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후임 교육부총리가 교육을 더 황폐화시키지 않으려면 ‘김진표 교육’의 실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규제와 평등지상주의 정책부터 자율과 경쟁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